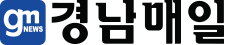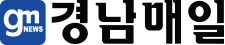그런데 고작 아홉 자다. 그런 말을 누가 만들었나? 이 어구 때문에 나는 사서(四書, 논어, 맹자, 중용, 대학)를 알게 되었다.
동양의 고전(古典)은 놀라운 지식의 보고다. 유가(儒家), 묵가(墨家), 도가(道家), 법가(法家) 등 그들은 놀라운 지식체계를 3000년 전에 모두 설파해 버렸다. 그때 중국인은 위대하다. 존경한다.
그때 우린 무엇을 했나. 단군 조선? 이유야 어쨌든 별 기록이 없다. 다만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우리 역사서에서 보면,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신라의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한 것이 BC 57년,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이 금 보자기에 싸인 9개의 알 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AD 42년,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가 계림의 금궤에서 발견된 것이 AD 65년이다. 이렇게 신화나 전설로 남아 있는 우리보다 무려 4~500년 앞서 제자백가들이 중원에서 대논쟁을 벌였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할말을 잊는다.
제자백가 중 누가 제일 좋은가. 공자다. 왜 공자인가? `공자 왈, 맹자 왈`로 나라까지 망했는데? 모르는 소리, 그는 공리공론을 싫어했다. "말을 앞세우는 것은 실행을 못 할까 두려워서다" 뿐만 아니라 말보다 행동을 앞세웠다. "말은 더디고 행동은 민첩하다." 이처럼 말을 앞세우거나 공리공론을 꺼렸다. 나아가 그는 관념적인 걸 꺼렸다. 인생론도 정치론도 모두 합리적이고 실용적 철학이다.
사람은 효도하고, 충성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정치는 "스스로 몸을 닦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알기 쉬운가. 유가의 철학이 형이상학으로 흐른 것은 공자의 손자가 쓴 `중용(中庸)` 이후이고, 송(宋)대 성리학(性理學)에 와서 너무 정교하게 다듬어진 바람에 관념적으로 된 것이다. 실은 주자(朱子)가 뛰어나도 너무 뛰어난 게 문제였다.
현실에 충실했던 공자는 사후 세계에 관한 얘기도 꺼렸다. "사는 것도 잘 모르는 내가 어찌 죽음에 대해 말하리오." 그뿐만 아니라 귀신, 괴이한 것, 폭력 같은 것은 입에도 담지 않았다. 훗날 우리 조상들이 공리공론으로 나라를 망친 것은 유교의 탓이 아니라 공자를 잘못 이해한 후학들의 잘못이다.
그는 성(性)이나 이(理) 같은 말보다 덕(德), 충(忠), 신(信), 의(義) 같은 용어를 좋아했다. 사람의 정서, 희로애락을 존중했기 때문에 금욕주의를 부정하였다. 인간의 실존적 존재, 삶 자체를 소중히 여겼다.
`논어`에 좋은 말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 말이 마음에 든다.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묻는다. "선생님의 일관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서(恕, 용서)라는 거지." 이어서 그는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남도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되지!" 내가 싫어하는 것 남 시키지 말라? 쉽고 당연한 말이지만 위대한 발언이다.
인간관계에서 이게 실천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린다. 예컨대, 리더십의 제1조는 모범이다. 모범은 대개 남이 먼저 하길 꺼리는 일이다. 전쟁 때 앞장서는 것, 아무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지휘자가 앞장서야 남이 따른다. 남이 원치 않는 것이니 내가 한다. 내가 먼저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걸 해야 리더십이 성립한다. 평범하지만 얼마나 위대한 발언이가.
정치사상도 소박하다. 실질적이다. 정치란 사람을 위한, 쉽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양적 휴머니즘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 지향적 성향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유교는 사람의 본성이 가진 덕성이 `세상을 밝히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