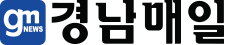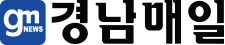우리 사회가 서구물질문명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유교 국가였던 이조 500년의 전통적인 예법은 이제 시대변화의 큰 물결 앞에 그 흔적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본성의 내면적 인식과 외면적인 행태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탐욕적 자본주의에 물들어 도덕과 윤리가 퇴락하고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연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과정의 정당성은 무시한 채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사고가 팽배해 `돈이 최고`라는 황금만능주의 세상이 되었다. 너나 할 것이 돈과 권력에 집착함으로써 사람 된 도리를 다하는 예(禮)와 의(義)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보이스 피싱 같은 날강도 사기꾼이 백주에도 활개치고 있다. <논어(論語)> 안연편 1장에 제자 안연이 스승 공자에게 인(仁)에 관하여 묻자 `극기복례(克己復禮,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감)`이라고 했다. 안연이 다시 그렇게 할 방법을 묻자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非禮勿視),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非禮勿聽), 예가 아니면 거동하지 말라(非禮勿動)`고 했다. 사람의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이것은 내 자신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오면 인(仁)이 된다는 뜻이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현대인, 특히 MZ세대에겐 씨알도 먹혀들지 않는 말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역에서 말했듯이 세상만사 소식영허(消息盈虛)하니 비룡재천(飛龍在天)할 때 항룡유회(亢龍有悔)를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실패를 두려워해 기죽을 필요도 없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둔(遯, 피함)하여 지난 일을 살피면 살길이 눈에 보이니 이게 바로 인의대로 사는 사람의 혜안이다. 물론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답게 예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다시 <논어> 안연편 11장을 보자.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경공(景公)은 노나라의 공자에게 치도(治道)를 자문받기위해 그를 초빙했다. 이때 경공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要體)를 물었다. 이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군군, 君君),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신신, 臣臣),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며(부부, 父父),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자자, 子子)`고 했다. 이때 경공은 좋은 말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군불군, 君不君),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신불신, 臣不臣),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부불부, 父不父),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자불자, 子不子), 곡식이 있다한들 내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소`라고 했다. 공자의 문답에 대한 경공의 현문우답(賢問愚答)이다. 당시 경공은 58년 동안 보위에 있으면서 대부들의 세력다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옳은 정사를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공자가 깨우치라고 말했는데 우유부단하게 원론적인 말만 한 것이다. 군주답게 자기 주관을 세워 혼란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계책이 무엇인지 자문하지 못한 경공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다.
임금이 임금다워야 함(君君)은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안백성(安百姓)이다. 신하가 신하다워야 함은 군주의 통치철학을 바르게 세워 잘 실천해야 함을 말한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지당(至當)만 남발하면 나라가 망한다. 부당함을 부당하다고 용기 있게 간언(諫言)할 수 있는 신하(관료)가 있어야 국정철학이 바로 선다. 부부(父父)와 자자(子子)가 더 어렵다. 은퇴 후의 저문 삶을 사는 필자 역시 정녕 아비다운 아비였는지 의문스럽기에 유구무언이다. 남들 다 가는 대학 보냈으니 부모노릇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결혼도, 살림나기도 각자 알아서 스스로 다했다. 아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셈이다. 비록 아비 노릇은 못 했지만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가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편치가 않다. 세상인심이 팍팍해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니 자연히 부모돌보기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자식들이 부모를 방기(放棄)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물질만능주의가 낳은 부작용이다. 독거부모가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난 사실을 자식들이 몰라서 그분들의 장례를 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세상이다.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적 예가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시대이다. 은퇴세대의 80%가 노후에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혈연관계인 가족제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군신신부부자자`는 상하위계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자답게, 학생답게, 정치인답게, 공직자답게, 기업인답게, 문화예술인답게, 스포츠맨답게 등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되고 사람노릇을 해야 사람대접을 받는다. 더불어 살기 위해 사람끼리 정해 놓은 불문율의 관습인 예(禮)를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다.